1922년 12월 3일에 소설집을 펴내면서 쓴 자서전적 글이다. 이 서문은 루쉰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제1소설집 납함의 서문 격인 이 글에 루쉰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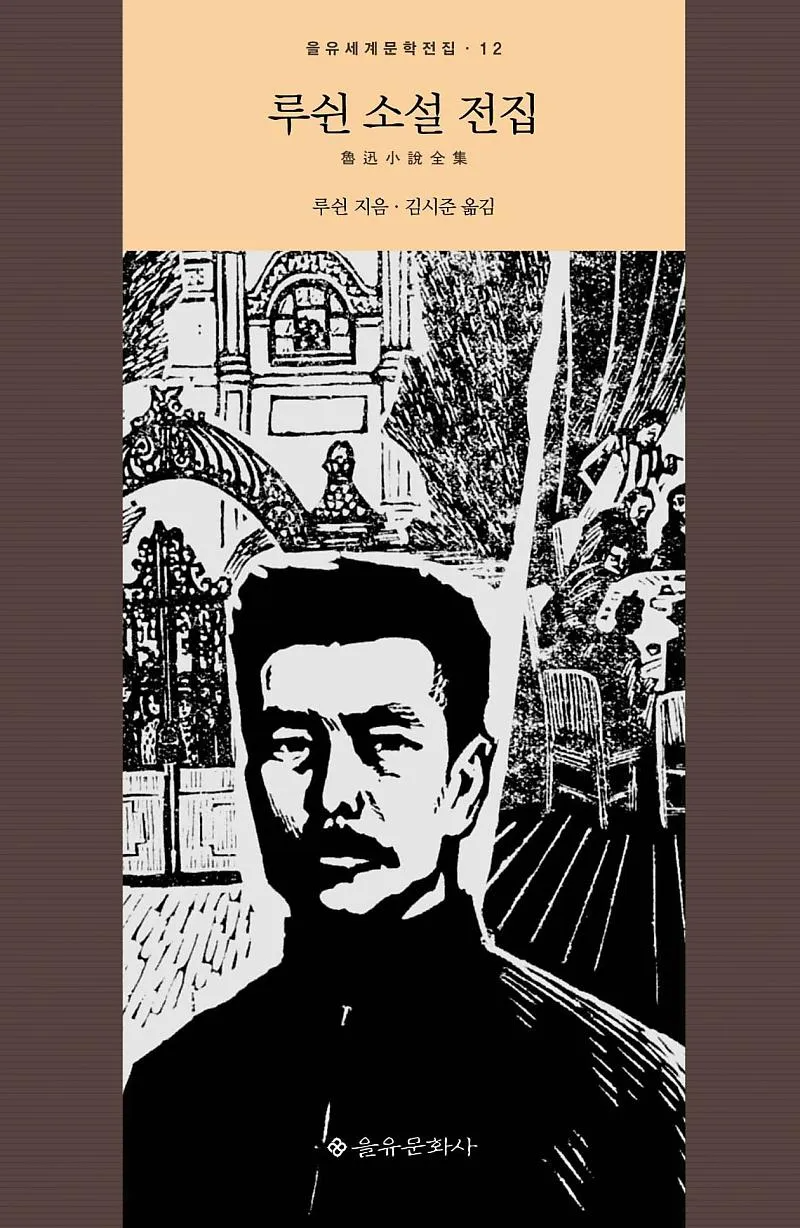
자서 요약
지난 세월이 잊히지 않아 이 납함(吶喊)을 쓴다. 오래전 나는 4년 동안 거의 매일 전당포와 약방을 드나들었다.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약을 사서 편찮으신 아버지의 약을 샀다. 어린 나에게 모멸감을 주는 일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누구든 먹고살 만하던 사람이 몰락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학당으로 떠날 때 어머니는 우셨다. 서양식 공부란 당시만 해도 천시당하던 학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곳에서 배우면서 한의사가 일종의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게다가 일본 유신의 태반이 서양 의학에서 발단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런 유치한 지식으로 나는 일본의 의학전문학교로 진학했다. 나는 군의(軍醫)가 되리라 생각했다.
강의가 일단락되고 나서도 시간이 남으면 교수님은 미생물을 보여주던 슬라이드로 풍경이나 시사에 관한 그림을 보여주곤 했는데, 당시가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이라 전쟁에 관한 화면이 많았다. 그중 하나는 한 중국인 스파이가 일본군에 의해 본보기로 참수당하기 직전의 사진이었다. 둘러싼 건장한 중국인들은 그 장면을 감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2학년이 종강하기 전에 나는 도쿄로 나와버렸다. 의학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란 깨달음 때문이었다. 몸이 아무리 멀쩡해도 우매하다면 하잘것없는 본보기의 재료나 관객이 될 수밖에 없으니, 병으로 죽는 것 따위야 불행도 아니었던 것이다. 당시 나는 정신을 고치는 데 문예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문예 운동을 제창하게 되었다.
동지들을 어렵게 모아 '신생(新生)'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기로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한 사람의 주장이 찬성을 얻게 되면 그것은 전진을 촉진하고, 반대를 얻게 되면 분투를 촉진하게 된다. 그런데 적막처럼 아무것도 없으니 갑갑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적막은 나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나는 나 자신의 적막과 싸워야 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비문을 베꼈다. 옛 친구 진신이가 그런 것들을 무엇에 쓰자고 베끼냐고 물었다. 아무 생각도 없다는 내 대답에 그는 내게 글을 좀 썼으면 한다고 권했다. 그들은 '신청년(新靑年)'이라는 잡지를 출판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적막함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답했다.
"가령 말일세, 쇠로 된 방인데 창문도 전혀 없고 절대로 부술 수도 없는 것이라 하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네. 오래지 않아 모두 숨이 막혀 죽겠지. 그러나 혼수상태에서 죽어가므로 결코 죽음의 비애 같은 걸 느끼지 못할 걸세. 지금 자네가 크게 소리를 지른다면 비교적 정신이 돌아온 몇 사람은 놀라서 깨어날 걸세. 자네는 이 불행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구제될 수 없는 임종의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미안하지 않다고 여기나?"
진신이는 내 말에 그러나 방을 부술 희망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으냐 반문했다. 그렇다. 희망이라고 한다면 지워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하여 나는 글을 쓰겠다고 응답했다. 그것이 '광인일기'이다.
나의 함성이 어떤 것인지 돌아볼 겨를이 없다. 그러나 고함인 이상 당연히 지휘관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 나의 소설이 예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짐작할 것이다. 그러나 소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책자로 묶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요행한 일이다.
위에서 말한 이유 때문에 '납함'이라 부르기로 했다.
1922년 12월 3일, 루쉰이 베이징에서 쓰다.
자서 독서 후기
납함이 어떤 뜻인지 의아해 국어사전을 찾아보았다. 명사로 적진을 향하여 돌진할 때 군사가 일제히 고함을 지름이라고 정의되어 있었다. 함성 같은 말이렷다. 중국 근현대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루쉰이 어째서 이렇게 소란스러운 제목으로 소설집의 이름을 지었을까?
격동의 시기를 살다 간 선구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제목이고 또 서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와닿았던 것은 누군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토로였다. 처음 문예운동의 일환으로 잡지를 발간하려고 했던 일이 실패했을 때 작가는 적막함으로 빠져들었다고 했다. 가고자 하는 길이 분명히 보였고, 해서 돌진하고자 했으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고독감, 낭패감, 무력감.....
젊은 시절, 어떤 꿈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어떤 방향에서든 이런 기분을 느껴본 바 있을 터이다. 루쉰은 그 적막, 그 침묵의 벽을 깨고 마침내 함성으로 대중을 선동하겠다고 나섰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 격동의 역사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들려온 그의 외침, 이제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고자 한다.
*루쉰 나무위키를 참고하면 그의 생애, 나아가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터이다.
